Reading Diary
언어(말)를 다룬 책들 본문
책 '라틴어수업'을 다시 읽으며 기억을 더듬는다. 지극히 나의 주관적인 기준에 비슷한 느낌을 주는 책들이 있다. 특히 라틴어수업같은 말이나 언어 자체를 다루는 책은 대게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단순히 라틴어수업처럼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언어를 주제로 한 책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책들이 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나 '말의 품격'은 읽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매우 흡사한 느낌의 책이다. 그렇다고 내용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야기하려는 주제나 방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언어'라는 소재에서 파생되는 그 느낌은 실로 비슷하다.
얼마 전에 읽었던 김이나 작가(작사가)의 '보통의 언어' 또한 마찬가지다. 언어를 다루는 사람 특유의 섬세함이 있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들의 모음인지라 읽을 때에는 따듯하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지만 인상이 옅다. 몇 몇 단란을 제외하고는 몇개월 지나지 않아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다.
라틴어 수업도 그렇다. 비록 '라틴어'라는 특유의 언어를 학문적으로 접근했지만, 그 접근법은 '언어의 느낌'그 자체에 있기에 위에 언급한 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이런 책들을 좋아하고, 수집한다. 이런 책들은 언어를 단순히 쓰는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쓰는 언어에 대한 고찰을 한 흔적이 있다. 내가 듣고, 말하는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사람은 생가보다 많지 않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의문과 갈증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베르나르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처럼 굉장히 독특한 각도로 언어를 들여다 보는가 하면, 라틴어수업에서 말 하듯, 'Love'라는 동사는 'move'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 가변성을 본래 지니고 있음을 깨닫기도 한다.
어원, 파생, 생각. 하나의 단어에서 뻗어나가는 이 모든 가지들은 우리의 상상력과 사고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언젠가 '말할 수 있는 언어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말을 배움과 동시에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간혹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외국어로는 아무리 적합한 단어를 찾아도 들어맞지 않는 말이 있다. '재수없어.'라는 말이 그렇다. 직역하면 unlucky라는 말, '운이 없다.'는 말이지만 이 말은 사실 그런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스스로 잘난채 하는 사람을 볼 때 시기도 질투도 아닌, 에이 아니꼬와라. 혹은 보기싫다.의 느낌에 가깝다. 또는 단순히 추임새처럼 스스로를 찬양하다니 오글거린다는 느낌으로 쓰기도 한다.
이 '재수없다.'는 느낌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른다. 재수없다는 말을 알아야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젠가 친구와 전화를 하다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참새의 눈물같은 월급이야.' 참새의 눈물이라니! 그 표현만으로 얼마나 적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지가 그대로 들어나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참새의 눈물 만큼은 아니지! 라고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쥐꼬리가 참새의 눈물보다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언뜻 해봤다.
언어에 대한 고찰을 할 때,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혹은 단순히 흥미가 생겼을 때 읽으면 재미있을 책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재미있는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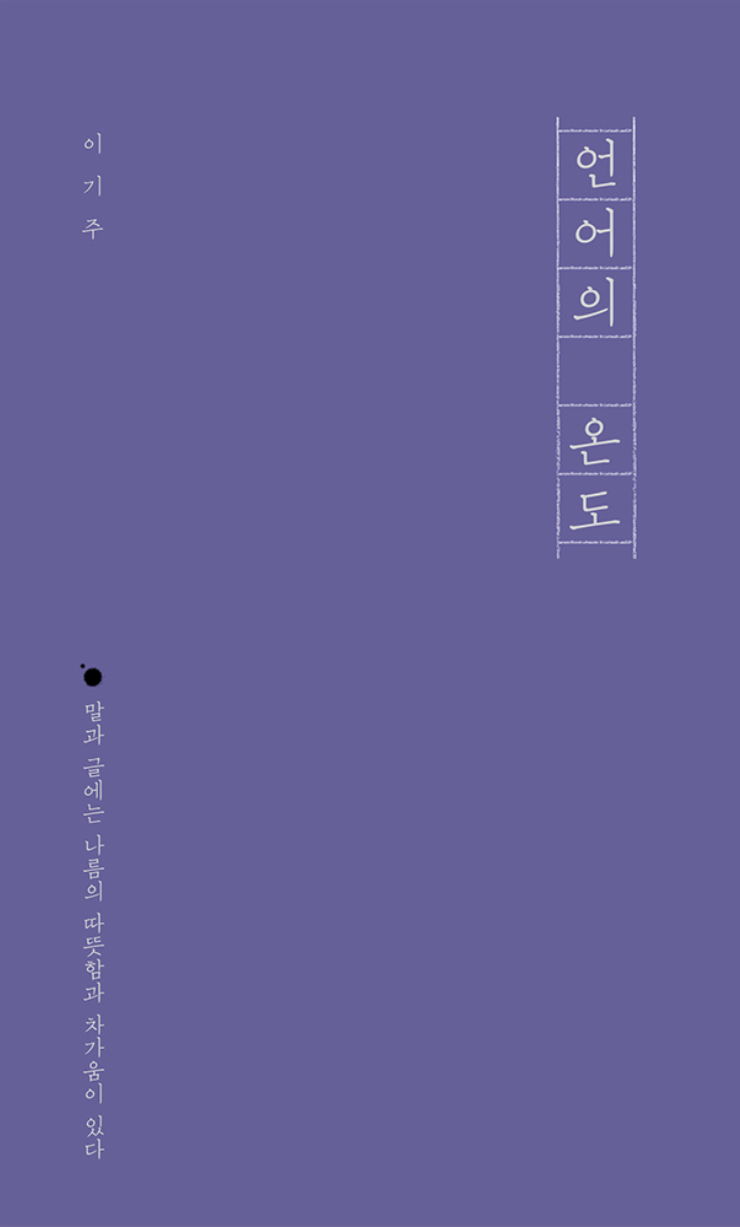
1. 언어의 온도
이기주 작가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이다. 170만부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새롭게 인쇄되었다는 홍보글을 전에 보았다.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온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말의 품격과 언어의 온도중에 고르자면, 언어의 온도를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한다. 작가님의 팬이 될지도 모른다.

2. 보통의 언어
소개할 책 중 가장 신간이기도 하고, '작사가'라는 평소에 언어를 다루는 (하지만 작가는 아닌) 사람의 신선한 시선을 볼 수 있다. 단순히 학문이나 언어 뿐 아니라 좀 더 '감성적인 측면'에서 언어를 많이 바라보게 된다. 사람의 사고는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것. 새로움 감성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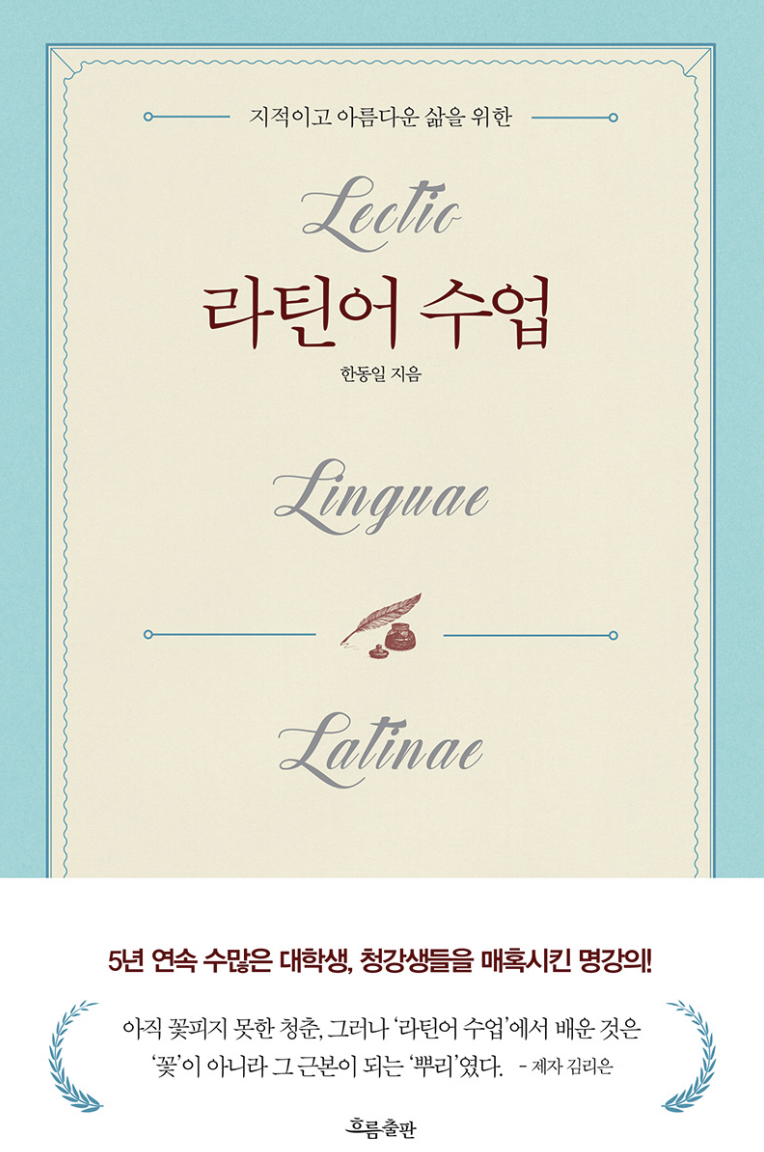
3. 라틴어 수업
대학 강당에서 유명한 수업이었다는 라틴어 수업을 직접 저자가 책으로 묶었다. 수업의 흐름과 비슷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단순히 문법 뿐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어는 영어에서 파생되어 한자로 번역되어 다시 한글로 옮겨진 것이 태반이다. 결국 라틴어의 어원은 대부분의 언어의 어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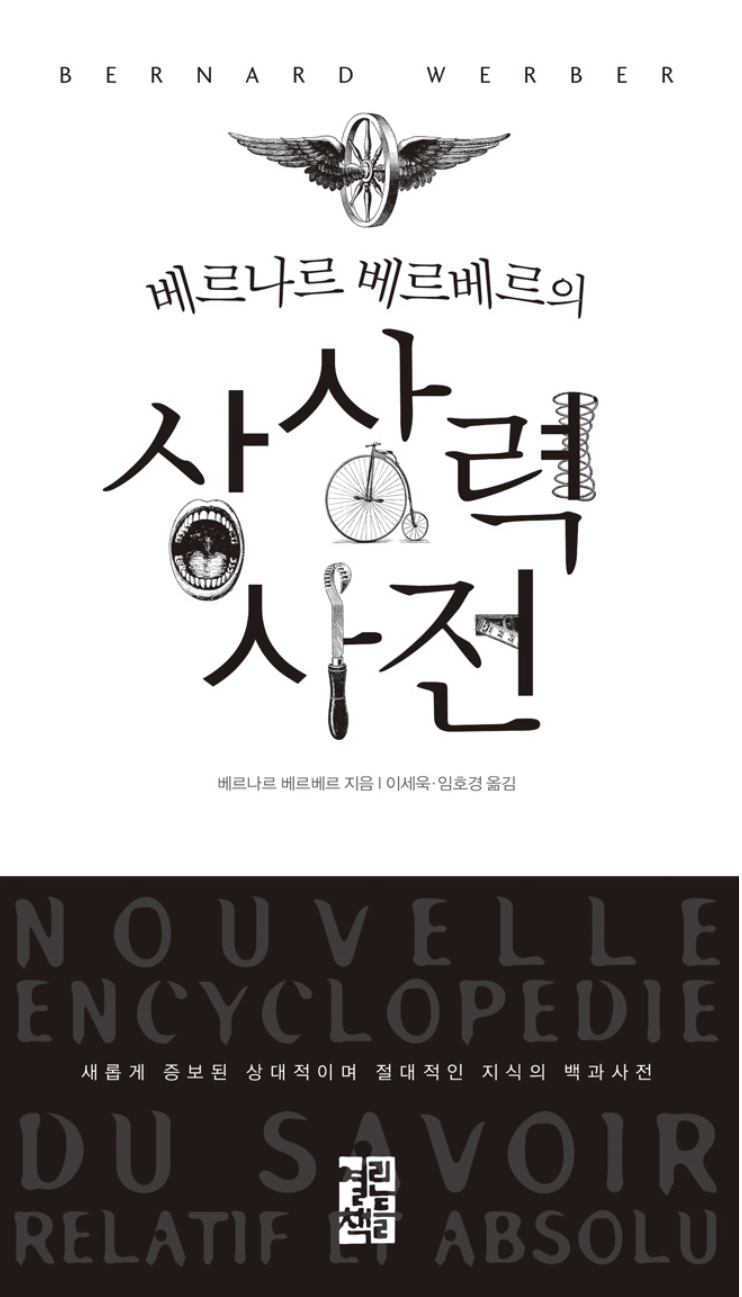
4. 상상력 사전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베르베르의 신선한 관점에서의 사전이다. 단어에 대한 그의 고찰 하나하나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단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과연 소설가 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다. 다만 책이 많이 두껍고 내용이 많아 보다 중간에 덮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의 특징은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다는 데에 있다.

5. 말의 품격
사실 언어의 온도를 먼저 읽었다면 크게 감명을 받기 어려운 책이기는 하나, 역시 추천한다. 이런 책들은 '이 책을 다 읽어야지!' 라거나 '이건 꼭 읽어야해!'보다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찬찬히 읽어주는 말동무같은 느낌이 강하다.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며 읽기를 권장한다.
언어 자체에 대한 책들은 이정도인 것 같다. 언어 자체는 아니지만 언어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은 무긍무진하다. 예를 들어, 미하엘 엔데의 '모모'나 아주 유명한 동화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리고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등이 있다. 이 이야기들은 언어를 소재로 하지 않지만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말씨. 라는 것에 대한 생각. ‘모모’는 듣는 이로서의 반응으로서의 언어. ‘침묵’도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또한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회색신사나 거짓말 투성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꾼의 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언어란 퍽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젠가 따로 리뷰할 나의라임 오렌지나무는 ‘어린아이의 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사람의 성숙도에 따른 말의 차이가 이 책에 확연히 드러난다. 흔히 사람의 말을 듣고 ‘철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이 특히 그렇다. 비록 그 과정은 퍽 슬프긴 하지만. 그리고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위로하는 책이다. 읽고 있으면 위로 받는다. 이런 글로 이런 형태의 말은 위로를 전하는 책이라는 걸 읽다보면 느낀다.
우리는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에 개해 기억하고 반응한다.
‘모방하는 동물이자 망각하는 동물’인 우리는 그렇기에 원하는 언어를 더 많이 듣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언어로 채우기 위해서 말이다.
'Reading Diary > 에세이, 비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네트워크 마켓팅, 부자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0) | 2020.11.16 |
|---|---|
| 몰입, 독서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0) | 2020.11.02 |
| 말을 어루만지는 책, 보통의 언어들 (0) | 2020.09.27 |
| 쉬어도 피곤한 당신께 추천하는, 최고의 휴식 (0) | 2020.08.10 |
| 오래 준비해온 대답 by 김영하의 시칠리아 (0) | 2020.07.20 |




